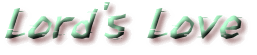7탄 뭉치와 탈북자
7탄 뭉치와 탈북자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침 좀 뱉던 축에 끼어 있던 뭉치가 침 뱉기를 거부한 것이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침을 찌익찌익 뱉어야 싸나이 중의 싸나이라고 했던 얄개소년 뭉치가 드디어 개과천선을 한 모양이다.
"뭉챠 뭔 일 있냐?"
"아무 일도 없어"
뒤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기우뚱 거리며 걸으며 길을 가던 중이다. 뭉치의 말을 듣고는 꽁깽이가 멈춰 섰다. 오른 쪽 다리를 달달 떨면서 아니꼽다는 눈초리로 뭉치를 쏘아 봤다. 뭉치는 곁눈으로 꽁깽이를 흘겼다.
"그럼 대형사고 쳤냐?"
"시끼야 사고는 무신 사고여 너 같은 줄 아냐. 글고 눈깔로 까불지 말어라. 요걸로 쿡 찌르기 전에"
뭉치가 두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며 두 번째 관절을 구부려 갈고리를 만들어 꽁깽이의 눈으로 가져가며 겁을 준다.
"야가, 야가 찌르것다"
꽁깽이가 꼬랑지를 내리고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야 이따가 보자. 집에 갔다 올란다."
"알았어. 오거나 말거나"
뚱한 표정으로 꽁깽이가 뒤로 돌아서는 뭉치를 흘기며 꼬진 목소리로 내뱉듯 말했다.
"꼴깍"
돌아 서 오는 길에 침을 삼켰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껌을 잔뜩 씹고 침이 고이면 혀끝에 힘을 주어 이빨 사이로 침을 몰아 혀끝으로 압력을 주어 퉁겨주면 침은 멀리 나가게 되어 있다.
"꼴깍"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억누르며 침을 삼켰다.
"그거 알어?"
"뭐를?"
"침을 자주 뱉으면 폐병 걸린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뭉치는 그 날 이후로 침을 뱉지 않고 삼키기 시작했다. 폐병에 걸리면 나굴이와도 땡까고 그러면 노후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터이다.
"히히히"
고양이를 몰아내고 난 날 이후 나굴이는 뭉치에게 나실나실 해졌다. 나실나실 해졌다는 말은 "고분고분+교태"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굴이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굴이 말이라면 뭉치가 토를 달지 않고 잘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인데, 뭉치는 나굴이가 자신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나굴이가 침을 뱉으면 폐병에 걸린다는 말은 의사의 말보다 더 확실한 효력이 있었다.
침을 뱉지 않게 되니 할 일이 하나 없어진 것처럼 허전하기만 하다. 그래서일까. 얼마 후가 되니 뭉치는 길바닥에 있는 것이라면 돌맹이로부터 시작하여 깡통 등 뭐든지 발로 차고 다녔다. 이것도 숙달이 되니 꽤나 재미가 쏠쏠하다. 뭉치는 자신의 마음속에 표적을 만들어 놓고는 그쪽으로 냅다 걷어찼다.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 차츰 차츰 잘 맞기 시작했다.
고뇌였다. 뇬뇬이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굴이를 만날 때 마다 슬며시 비켜 앉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나굴이는 바짝 땅겨 앉았다. 모르는 척 뭉기고 있자니 속이 바글바글 끓고 말을 내자니 맞아 죽을 일이다. 그렇다고 뇬뇬이가 하도 당차서 깜냥도 되지 못하는 터에 어떻게 처리를 해 볼 수도 없고 나굴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뭉치의 속이 타들어간다. 요즘은 만사가 귀찮고 시들해지는 것이어서 세상사는 재미도 없거니와 밥맛도 별로 없다. 나굴이를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핑글 도는 것이어서 나굴이가 만나자고 해도 슬금슬금 피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에라이 닝기미”
앞에 깡통이 있길래 발에 힘을 모아 힘껏 내질렀다. 깡통은 충격을 받고 높이 날아 포물선을 그리며 숨어서 딱지를 끊고 있던 경찰차 뒷 유리창을 정통으로 맞췄다. 순간적으로 뭉치가 뒤를 돌아보니 아뿔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퍼뜩 제정신이 들었다. 경찰은 얼마나 놀랐는지 권총을 빼들고 납죽 엎드려서 벌벌 거리며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 혐의점을 빌딩에 두었는지 빌딩부터 휘휘 둘러보고 있다. 볼 것도 없었다. 옆에 있는 골목으로 냅다 튀었다. 눈썹이 휘날렸다. 다행히 경찰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도 뛰었다. 저 앞에 몇 명의 사내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니 보라우 청년 전쟁 일어났세까?”
힐끗 쳐다보고는 대꾸도 없이 그저 뛰었다. 언덕이 있는 산 쪽이었다. 뛰면서 뒤를 돌아다보니 사내들이 뭉치의 뒤를 쫓고 있다. 대여섯 명쯤 모여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언제 늘어났는지 열 명은 넘어 보이는 떼거리가 뭉치의 뒤를 쫓아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 다급해진 뭉치는 사추리에서 요령소리가 들릴 정도로 뛰었다. 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냅다 달려가니 뒤에서 전속력으로 쫓아오던 패거리들이 꽥꽥 소리를 내며 진력을 다하는 느낌이다. 이러다가는 잡히겠다 싶어 숲속으로 뛰었다. 꽥꽥소리가 더 커졌다. 설마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싶어 가시덤불이 수북한 수풀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때였다.
“니 보라우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소.”
아줌마 너구리와 애들 너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두 손을 번쩍 쳐들고 항복자세를 취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너구리들은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입술을 비쭉이며 으앙하고 울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
“빨리 도망가세요. 깡패 너구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기래요? 토끼라우.”
아줌마 너구리가 애들 너구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는 뭉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아줌마 너구리는 소리를 질렀다.
“남조선 깡패들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 왔다니 끼니 날래 토끼라우”
어디에서 짱 박혀 있다가 나타났는지 보퉁이를 머리에 인 아줌마 너구리들과 애들 너구리들이 사방에서 튀어 나와 깽깽 울면서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냅다 달리던 아줌마 너구리가 뒤를 돌아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갱갱이 아베다. 갱갱이 아베.”
뭉치 뒤를 따라 도망하던 무리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깡패가 아냐? 뭉치도 멈춰 섰다.
“내레 북에서 왔수다래.”
뭉치와 인사를 나누며 갱갱이 아베가 자신을 소개했다. 뭉치는 머리에 털이 난 이래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북에서 내려온 너구리를 본 적이 없었다. 뭉치는 신기하다는 듯 이리저리 따져보고 훑어보았다.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맹판 똑같았다. 좀 굶은 사람 같이 보인다는 것 빼고는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그제야 안심을 하고 뭉치는 그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50명은 넘어 보이는 무리였다. 중학생일 것 같은 여학생도 보였다. 여학생은 뭉치의 시선을 받고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죄다 얼굴이 컴컴해 보일 정도로 어두워보였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무얼 하면서 생활할 것인가요?”
“기러게 말이외다. 막상 내려오기는 했는데 남조선에 내려와 보니 기가 딱 딜리고 말입네다. 대책이 없시오.”
그러게 무슨 대책이 있겠나.
|
 총신80회동문
총신80회동문  빵학년과엄마들
빵학년과엄마들  학생회원모여라
학생회원모여라  청년부코이노니아
청년부코이노니아  교회&사업장광고
교회&사업장광고  해외선교사소식란
해외선교사소식란